앱 시장은 레드오션
앱 시장은 정말 레드오션일까?
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에 잠깁니다.
만들만한 주요 앱이 다 나온 걸까? 그런 것 같습니다.
그런데도 새로운 앱은 계속 쏟아집니다.
온라인 공간이니 망정이니 오프라인 공간이었다면 경쟁자를 선 밖으로 밀어내는 전쟁터란 게 훤히 보일지도요.

전쟁터나 다름 없는 앱 시장
블루오션일 때는 과연 있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.
2010년이면 블루오션이었을까?
2012년까진 괜찮았을까?
시대를 읽는 눈이 없는 저는… 아이폰을 본 후에도 앱 개발에 뛰어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…
그때 시장에 뛰어들었더라도 내가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?
잘은 몰라도 마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서 달리기를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.

선착순으로 달려가서 깃발만 꼽으면 땅을 준다던 믿기 힘든 시절. 영화, 파 앤드 어웨이
예전에는 앱 시장이 무주공산이어서 아무 앱이나 만들어도 대박이었다고들 얘기합니다.
그랬을지도요.
하지만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.
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리를 지키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.
재밌는 것은…
2008년,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‘포화 시점’이라 생각했다는 것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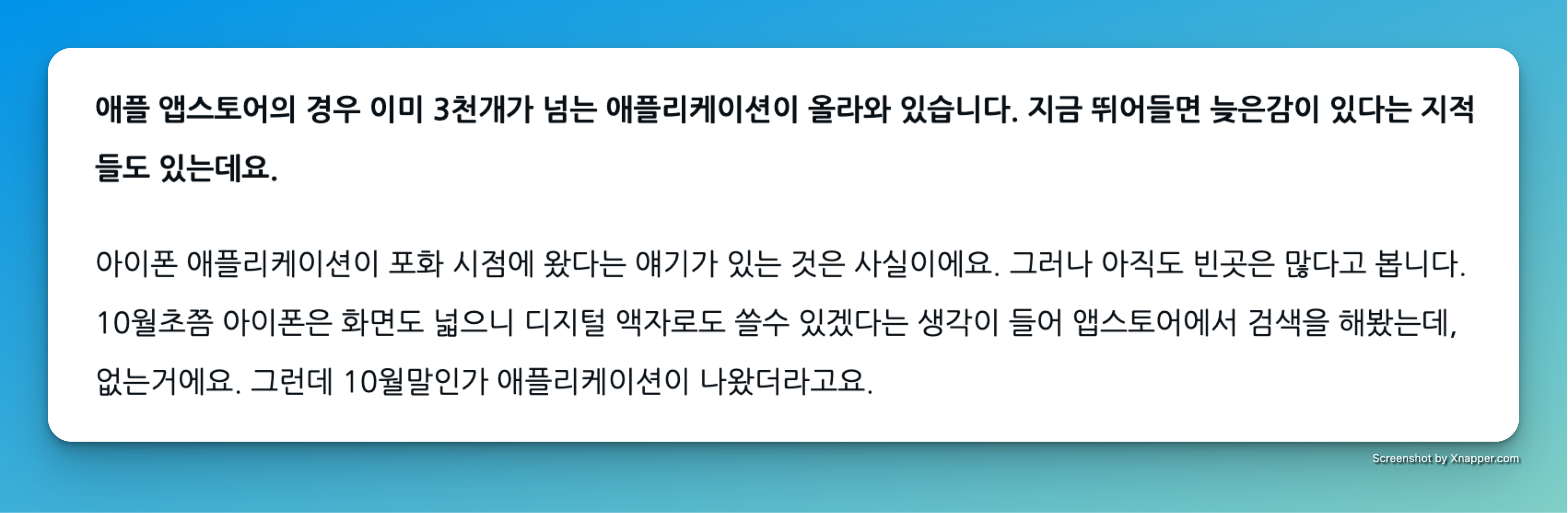
아이폰이 국내에 출시하기도 전인 2008년 11월의 기사
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.
이건 앱 개발자의 숙명 같은 겁니다.
이 시장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.
자본 하나도 없이 몸뚱이와 노트북만으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곳.
노트북 하나만 들고 세계를 여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.
이런 시장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.
하지만.. 안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습니다.
모바일뿐만 아니라 워치, 자동차, TV 등 앱을 올릴 수 있는 곳이 더 많아졌습니다.
비전프로도 나옵니다.
앱을 만들기는 점점 더 쉬워집니다.
기회는 계속 있고… 10년 뒤 돌아봤을 때…
지금이 바로 블루오션이었다 말할지도 모릅니다.
늦었다고 가만히 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.
함께 읽으면 좋은 글: